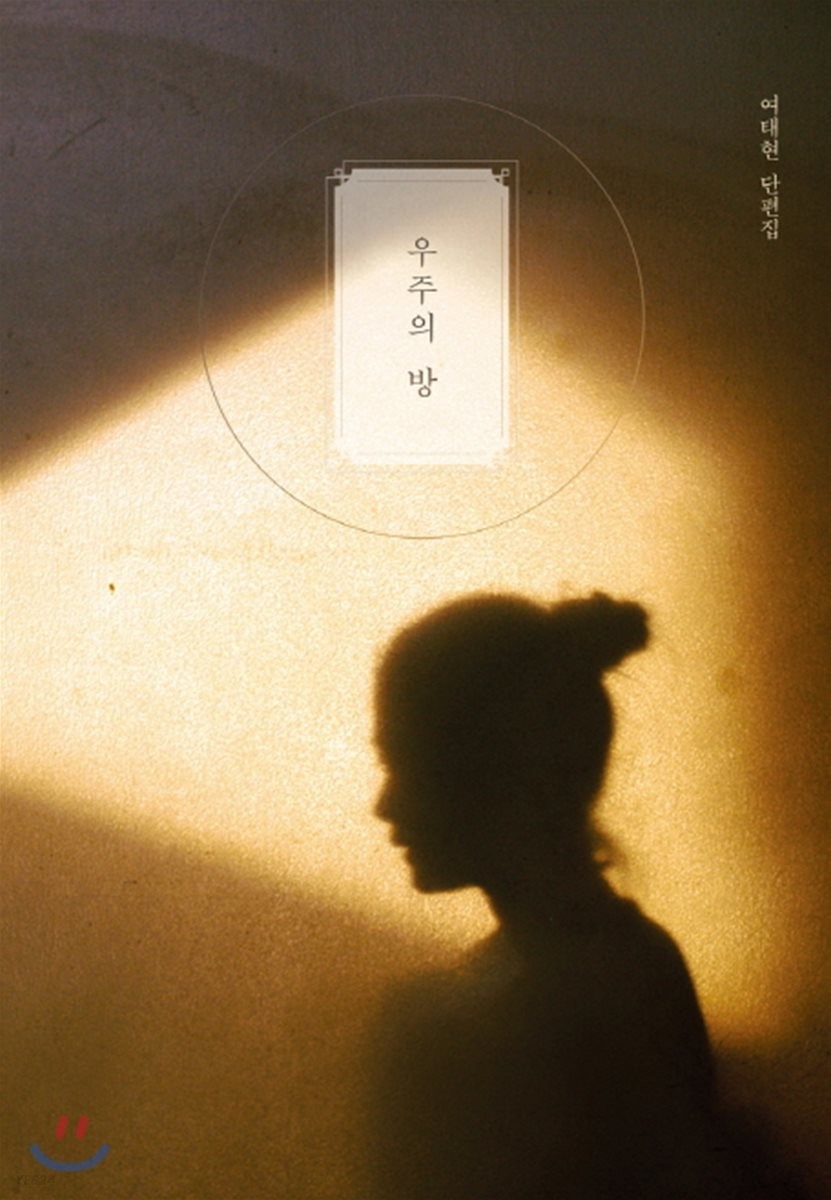
목차
- 1. I Feel Blue
- 2. 죽은 행성
- 3. 우주의 방
- 4. 편지
- 5. 물냄새
- 6. 연희
- 7. 경계
- 8. 영등포 구청
- 9. 다도
- 10. 열대어
책 속으로
어쨌거나 ‘죽음’, ‘삶’, ‘천국’, ‘Knockin' On Heaven's Door’ 같은 단어들은 우리의 젊은 시절을 크게 관통하는 하나의 화두였다. 서양 철학사를 들춰보고, 모더니즘이니 포스트모더니즘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떠들다가도 결국엔 원점으로 회귀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던 시절이었다.
---「I FEEL BLUE」중에서
컨디션이 괜찮을 때면 종종 고향집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죽을 때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그립더라는 것이다. 기시감이 든다. 내내 고향을 떠올리던 김 할머니가 떠오른 탓이다. 어쩌면 천국은 그리운 곳의 모양을 하고 있을까. 죽은 뒤엔 그리움이 잔뜩 묻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걸까.
---「우주의 방」중에서
언니, 사람을 안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런 소리를 하면 언니는 또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저 ‘안다는 건 그냥 단순히 알고 지낸다는 건데, 네가 너무 단어에 집착하는 건지도 몰라. 수정아.’ 하시겠죠? 하지만 언니 저는 알고 싶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편지」중에서




